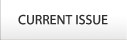중세 동아시아의 생명, 신체, 물질, 문화 탐구: 고려의 『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Abstract
The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鄕藥救急方, Hyang’yak Kugŭpbang) (c. 14th century) is known to be one of the oldest Korean medical textbooks that exists in its entirety. This study challenges conventional perceptions that have interpreted this text by using modern concepts, and it seeks to position the medical activities of the late Koryŏ Dynasty 高麗 (918-1392) to the early Chosŏn Dynasty 朝鮮 (1392-1910) in medical history with a focus on this text. According to existing studies,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is a strategic compromise of the Korean elite in response to the influx of Chinese medical texts and thus a medical text from a “periphery” of the Sinitic world. Other studies have evaluated this text as a medieval publication demonstrating stages of transition to systematic and rational medicine and, as such, a formulary book 方書 that includes primitive elements. By examining past medicine practices through “modern” concepts based on a dichotomous framework of analysis — i.e., modernity vs. tradition, center vs. periphery, science vs. culture — such conventional perceptions have relegated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to the position of a transitional medieval publication meaningful only for research on hyangchal 鄕札 (Chinese character-based writing system used to record Korean during the Silla Dynasty 新羅 [57 BC-935 AD] to the Koryŏ Dynast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is dichotomous framework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medicine. As such, this study first defines “medicine 醫”, an object of research on medical history, as a “special form of problem-solving activities” and seeks to highlight the problematics and independent medical activities of the relevant actors. Through this strategy (i.e., texts as solutions to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to determine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Ultimately, this study argues that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was a problem-solving method for the scholar-gentry 士人層 from the late Koryŏ Dynasty to the early Chosŏn Dynasty, who had adopted a new cultural identity, to perform certain roles on the level of medical governance and constitute medical praxis that reflected views of both the body and materials and an orientation distinguished from those of the socalled medicine of Confucian physicians 儒醫, which was the mainstream medicine of the center. Intertwined at the cultural basis of the treatments and medical recipes included in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were aspects such as correlative thinking, ecological circulation of life force, transformation of materiality through contact, appropriation of analogies, and reasoning of sympathy. Because “local medicinals 鄕藥” is understood in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as referring to objects easily available from one’s surroundings, it signifies locality referring to the ease of acquisition in local areas rather than to the identity of the state of Koryŏ or Chosŏn. As for characteristics revealed by this text’s methods of implementing medicine, Korean medicine in terms of this text consisted largely of single-ingredient formulas using diverse medicinal ingredients easily obtainable from one’s surroundings rather than making use of general drugs as represented by materia medica 本草 or of multipleingredient formulas. In addition, accessible tools, full awareness of the procedures and processes of the guidelines, procedural rituals, and acts of emergency treatment (first aid) were more important than the study of the medical classics, moral cultivation, and coherent explanations emphasized in categorical medical texts. Though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can be seen as an origin of the tradition of emergency medicine in Korea, it differs from medical texts that followed which specializing in emergency medicine to the extent that it places toxicosis 中毒 before the six climatic factors 六氣 in its classification of diseases.
색인어: 향약구급방, 한국의학사, 고려, 거버넌스, 몸, 물(物), 실행, 문제풀이, 스타일
Keywords: Hyang‘yak Kugŭpbang, History of Korean Medicine, Koryŏ Dynasty, Governance, Body, Material, Practice, Problem Solving Activity, Styles of Practice
1. 머리말
고려의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은 현전하는 한국의 의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이 책은 대장도감(大藏都監, 1232년 설치)에서 처음 간행된 이후 조선초기인 1417년과 1427년 두 차례 중간됐지만, 이 중 현전하는 것은 1417년 중간본이 유일하다. 초간본은 고종대 이후 고려후기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확실한 연대와 편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1]. 중간본 『향약구급방』은 완본 형태로 상, 중, 하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은 식독(食毒), 자액(自縊) 등 18개, 중권은 정창(疔瘡), 동창(凍瘡) 등 25개, 하권은 부인잡방(婦人雜方), 소아잡방(小兒雜方) 등 12개 항목으로 편제되어 있다. 각 질환마다 활용할 수 있는 처방 550여개 혹은 치료 방법 관련 조문 600여개를 담고 있는 이 『향약구급방』은 중세 의료의 문화적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기도 하다[ 2]. 본 연구는 근대적 관념들을 동원해 『향약구급방』을 파악코자 했던 전통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의서를 중심으로 한 여말선초 의학의 실행 양상을 한국 의학사의 지형에 다시 그려보기 위한 비평적 시론이다. 『향약구급방』에 대한 그간의 연구가 고려의학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식은 물론 학계의 논의조차도 여전히 근대적인 관념 즉 중심 대 주변, 과학 대 문화, 근대 대 전통, 이론 대 실천이라는 이른바 이분법의 분석틀 아래 작동해 왔다. 당약(唐藥)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향약(鄕藥) 담론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중심인 중국에서 주변인 고려/조선으로 흐르는 양단 구도를 논의의 전제로 삼고( 马伯英, 2010: 21)[ 3], 『향약구급방』이 중국에서 나온 의서와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결국 계보학상 중화세계 주변부의 의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4].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 책이 오히려 고유의학에 대한 자의식을 표출한 선구적 텍스트라고 이해되기도 했다( 金斗鍾, 1981: 141). 또 다른 관점은 이른바 현재주의를 따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전근대기 미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방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특정 약물의 경우 이른바 과학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려인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논급하거나[ 5], 혹은 이 텍스트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학으로의 이행단계를 보여주는 중세의 문헌으로 규정하는 서술이 그것이다( 김기욱 외, 2006: 153-154). 이러한 시선 아래에서 『향약구급방』은 종종 향찰(鄕札) 연구에나 의미 있는 중세의 과도기적 문헌으로만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할 것은 그간 연구자들이 『향약구급방』을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단계의 문헌으로 보고 『향약집성방』이 제기한 양단의 틀 안에서 『향약구급방』을 이해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학사 연구의 선구자였던 미키사카에(三木榮) 및 김두종 이래 대부분의 학자가 취했던 관점으로, 최근의 연구조차도 『향약구급방』을 비롯한 향약의서들을 두고 여말선초 학자들이 최신 중국 의서의 유입에 대처하는 전략적 산물이라거나, 혹은 중국의학의 적극적 수용과 향약에 대한 자각을 보여주는 문헌으로 이해하곤 했다. 근대적 관념들에 뿌리를 둔 이분법의 설명틀은 『향약구급방』 나아가 동아시아 의학의 지형을 제대로 드러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글은 타자로부터 주어진 질문이나 인식틀이 아닌 내외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역사의 주체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이분법의 역사서술을 넘어 동아시아 의학의 지형을 기술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의학 활동의 의미를 새겨보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개념적 범주 및 관련 질문들을 살펴볼 것이다[ 6]. 이를 위해 먼저 의학사 서술의 대상이 되는 “의(醫)”를 ‘특별한 형태의 문제 풀이 활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7]. (이러한 규정은 발전사관 및 현재주의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때 이른바 ‘문제’는 몸, 질병, 의료, 보건 등과 관련된 것일 테지만 그 문제의 구성 및 해법의 양상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의(醫)”가 행해지는 시대적 배경 및 환경 그리고 이를 추동했던 문화적, 사상적 흐름 및 역사 주체들의 지향점 등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의(醫)” 관련 행위자들의 논점들을 검토해 보건대,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의학 활동의 주된 논제들은 대개 세계/몸, 질병, 텍스트, 지식, 효과, 환자-의사 등과 같은 개념적 범주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문제 풀이로서 동아시아 의학활동을 탐구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와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류하는가? 텍스트와 관계 맺는 방식은 무엇인가? 지식 및 전통의 성격은 무엇이고 전수는 어떤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가? 의학적 효과를 내는 기제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를 주장하기 위한 도구, 기술, 전략, 담론은 무엇인가? 환자-의사 대면 방식에서 드러나는 권력 관계 및 윤리적 문제는 어떠한가?[ 8] 이러한 접근방법 및 연구질문의 이점은 이론, 학파, 유의(儒醫) 중심의 단순화되고 종종 왜곡됐던 종래의 역사 서술을 넘어 동아시아 의학의 다른 지형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범주 혹은 연구방법론에 얽매이지 않고, 『향약구급방』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의학활동을 보다 정당하게 그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변증논치(辨證論治)” 혹은 상관적 사유체계로 대표되는 이론 중심의 역사서술은 의학이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건 및 의미를 차폐시키곤 한다[ 9]. 지역, 이론, 계보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학파 중심의 의학서술 방식 역시 학파에 속하지 않았던 대다수 의학 행위자를 논외로 남겨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학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됐던 의사들조차도 위에 언급한 질문들을 풀어내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고 오히려 타 학파에 속한 의사들과 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구급(救急), 상과(傷科), 치종(治腫), 접골(接骨), 검시(檢屍), 군진(軍陣), 산과(産科) 혹은 상한(傷寒) 등의 분야에서 의인들이 이해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몸은 체액이나 물질 그리고 구조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 주로 유의 및 유학자들의 의론에 초점을 둔 기왕의 역사 서술은 대체로 음양오행이나 유가철학 등의 우주론적 사유에 의학적 몸을 종속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의학을 단순화 시켜왔다. 이러한 이론, 학파, 유의 중심의 역사 서술 무대에는 경험처방의 나열로만 보이는 『향약구급방』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서술방식과 달리 본고에서 시론적으로 제시한 접근방식은 이를테면 『향약구급방』(14세기), 『치종지남(治腫指南)』(16세기),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1644), 『역시만필(歷試漫筆)』(1734), 『마과회통(麻科會通)』(1798),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1894)과 관련된 의학활동에 상호 대등하게 의사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여타 의학적 성과 등과 견주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의학지형을 드러내는 데도 유효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의(醫)로서 『향약구급방』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었으며, 그 해법으로 강구한 『향약구급방』의 의학실행 스타일은 다른 의학활동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논의한다.
2. 의제: 문제 풀이 활동으로서 『향약구급방』
『향약구급방』이라는 의학 텍스트 관련 행위자들의 의제는 중국 선진의학의 유입/도입, 자주적 의학의 발로, 합리적 의학의 전구라는 의학적 문제보다는 사인층(士人層)의 “거버넌스”라는 맥락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절의 논점이다. 원래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최근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정부의 독점적 통치를 벗어나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시민사회 혹은 시장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해 쓰던 것이었다(김석준 외, 2000). 이 글에서 다소 생소해 보이는 “거버넌스”란 용어를 취한 까닭은, 예를 들면 의료제도라는 용어만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관아 주도의 공적인 체계나 제도적 장치 이외의 공간에서 역사의 주체들이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가는 현상을 제대로 기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논컨대 사인들은 공적인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박시제중(博施濟衆)의 이상을 실현코자 했다.
먼저, 현전하는 1417년 중간본 『향약구급방』에 수록된 기사 일부 및 발문을 살펴보면 이 텍스트와 관련된 주체 및 지향점 등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이상 [『향약구급방』에서 다룬] 총 53부 모두는 급작스런 일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이며, 표리냉열(表裏冷熱)을 다시 살피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병을 기록한 것이다. 효과가 있는 단방(單方)이더라도, 표리냉열을 살핀 다음에야 써야 하는 것이라면 기록하지 않았다. 잘못 써서 해를 끼칠까 걱정해서다. 사대부들은 잘 살펴 쓰기를 바란다[11]. [강조는 필자] 『향약구급방』은 효과가 아주 신기하고 영험하여 조선 백성에게 도움 되는 바가 크다. 수록하고 있는 여러 약들은 모두 조선 백성이 쉽게 알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며, 약을 만들고 복용하는 법 역시 이미 경험을 거친 것들이다. 만약 서울 같은 큰 도시라면 의사가 있겠지만, 궁벽한 시골에 있다면 돌연 급작스런 일을 만나 병세가 심히 긴박하더라도 좋은 의사를 불러오기 힘들다. …… 이제 이 책을 펴내 널리 전하고 나라의 명맥을 오래 잇게 하니 그 어짊[仁]이 백성[民]에 미치는 바가 깊다[12]. [강조는 필자]
이 두 기사를 요약해서 풀어보면, 『향약구급방』은 고려/조선 백성[東民]이 쉽게 알 수 있는 병[易曉之病]과 쉽게 알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약[易知易得之藥]을 다루며, 주로 궁벽한 시골에서 미처 어쩔 새 없이 급작스런 일[倉卒]을 당했을 때 유용한 방서로서, 사대부(士大夫) 즉 사인층을 독자로 상정하며[ 13], 표리냉열(表裏冷熱) 등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 없는 비전문가용으로 구성됐다는 말이다[ 14]. 그렇다면 이 텍스트의 생산자는 누구인가? 현전하는 『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초간본 및 삼간본과 관련된 행위 주체들을 논컨대, (직접 저술자는 아닐지라도) 『향약구급방』의 생산자 역시 여말선초의 사인층일 가능성이 높다[ 15]. 두 번에 걸친 재간행 사업은 지방의 관아에서 사대부 즉 사인들이 나서서 진행했다[ 16]. 초간본 역시 국가기관인 대장도감에서 간행됐는데, 중간본의 발문 외에는 그 간행 경위를 보여주는 공적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향약구급방』을 처음 기획한 사람이 고려의 왕/황제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면 관련 기록이 있을 법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초 사대부 관료가 정치적 타자였던 이전 왕조의 군주가 나서서 만든 책을 특별한 언급 없이 조선의관부에서 재간행하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초간본은 고려의 왕/황제가 기획했을 가능성은 낮다. 『향약구급방』을 저술하고 생산한 사람이 전문의관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조선중기 이후의 사정과 달리 고려시대의 의관은 상위 타 관직으로의 진출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의관 역시 넓은 의미의 지배적 엘리트인 사인층에 속하기 때문에( 신동원, 2014: 146-148), 이 경우도 『향약구급방』의 저술 및 간행을 기획한 주체가 사인층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문신 이규보(李奎報, 1168-1241) 개인의 문집이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사례는 초간본의 편찬자도 사대부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17]. 최소한 초간본은 논외로 하더라도, 재간본 및 삼간본의 경우 『향약구급방』을 생산한 주체는 신유학의 문화적 풍토를 배경으로 하는 사인층이다. 요컨대, 『향약구급방』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는 ‘일상의 구급[倉卒/救急]’, ‘이효지병(易曉之病)’, ‘이득지약(易得之藥)’, ‘비전문가’, ‘인민(仁民)’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사인층’이다. 책을 편찬하고 간행한 집단이 대표적 식자층인 사인들이라는 주장은 일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책을 낸 것이 논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일이거나 맥락이 없는 우발적인 사건은 아니다.
사실 의학지식을 (재)생산하고 이를 공간(公刊)하는 행위는 당시 신유학의 문화적 풍토를 배경으로 하는 사인들의 지식활동 상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경우 송대(宋代)까지의 의학지식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순우의(淳于意), 편작(扁鵲), 화타(華佗), 손사막(孫思邈), 허숙미(許叔微), 전을(錢乙) 등이 남긴 치험 사례 기록은 본질적으로 예언적이고 전설적이며 일화적인 것이며, 지식은 사제간 사적인 형태의 교육 및 전수 양상을 띠는 것이었다. 대개 이들 의학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의학지식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지식사회학의 지형은 송, 금, 원대 이후 유의가 등장함에 따라 비의적(秘儀的)인 가전(家傳)과 사제간(師弟間) 전수 형태의 불투명한 신비형 의술 중심에서 신유학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학술형 의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18]. 한국의 경우 여말선초에 의가들의 사적인 공간이나 혹은 궁중의 비각에 머물렀던 의학 지식을 공간(公刊)의 방식을 빌어 공적인 지식으로 전변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19]. 그 주체는 바로 신유학을 수용했던 사인들이었으며, 그 문화적 동력은 비의적이고 신비적인 지식보다는 합리적이고 접근 가능한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널리 펴 제세구민(濟世救民)하려는 윤리적 자아상을 독려했던 유교문예전통이었다[ 20]. 고위 관원이었던 김영석(金永錫, 1089-1166)은 송과 신라의 의서를 열람하고 요긴한 것을 골라 세상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중입효방(濟衆立效方)』을 편찬해 세상에 전했다[ 21]. 역시 고위 관료였던 최종준(崔宗峻, ?-1246)은 『어의촬요방(御醫撮要方)』(1226)의 간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이규보가 쓴 서문에는 인정(仁政)의 이념과 사군자(士君子)가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汎濟含生] 뜻이 표명돼 있다[ 22]. 또한 이규보가 외향에 나갈 때 본초서를 챙긴 데서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의약서는 사인들에게 가깝고도 익숙한 것이었다( 신동원, 2014: 101, 104-105). 문신 이조년(李兆年, 1269-1343)의 경우 매에 대한 기술서인 『응골방(鷹鶻方)』을 편찬하기도 했는데, 이 책은 물(物, 매)에 대한 관형찰색(觀形察色), 본초약성(本草藥性), 수증치지(隨證治之) 및 제약법((劑藥法) 등을 논급하는 등 그 체제나 담고 있는 지식의 성격이 의서와 유사하다[ 23]. 이러한 사실은 사인들이 의약과 결코 멀지 않았으며 『향약구급방』과 같은 성격의 의방서를 편찬하고 공간하는 일이 박시제중하는 사대부의 지식활동 상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사실 여말선초에 의학 관련 지식이 비로소 공적 공간으로 나올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인쇄기술의 등장이겠지만, 중국의 사례와 달리 기술이나 시장이라는 요소보다도 지식에 대한 사인들의 인식론적 변화가 더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여말선초 이러한 지적 태도의 변화 외에 사인층이 “이득지약”과 “이효지병”을 앞세워 비전문가용 의학지식을 생산하고 널리 유포하게 했던 그들의 현실인식이나 문제의식 혹은 사회문화적 압력은 무엇이었을까? 당시에는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의료서비스는 희소재로 기능했고 이른바 중앙 이외의 공간은 거의 의료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다. 중앙 및 지방의 의료체계는 고려시대에도 법제화되어 있었지만(손홍렬, 1988: 87-164; 이경록, 2010: 85-174; 이현숙, 2007: 10-25), 사실상 백성이나 지방의 사족이 일상적으로 의료에 접근하기 쉽게 된 것은 그나마 조선후기 한양에서부터 상업적 의료가 활성화되고 지방에서도 민간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게 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김호, 1998; 신동원, 2004; 2006a; 2006b; 김성수, 2014). 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고려시대 궁중과 중앙이 사실상 독점했던 전문 의사와 귀한 약재 등 의료 자원은 군주가 귀족이나 사대부 등 소수의 지배 엘리트에게 충성의 반대급부로 주는 은전으로 일종의 “위세품(威勢品)” 역할을 했다( 이현숙, 2007: 9; 신동원, 2014: 133-137)[ 24]. 국가가 과거, 천거, 차출을 통해 전국의 유능한 의료 인력을 중앙으로 흡수하고 조공무역, 공납, 약점(藥店), 혜민국(惠民局), 제생원(濟生院) 등을 통해 약재를 독점적으로 관리했으나, 자원이 한정된 까닭에 전염병 횡행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 일상적 의료 서비스는 일정 품계 이상의 고위 관료에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5]. 결국 의료 자원을 독점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소수의 왕족 및 공경대부를 제외하고, 일반 사인층과 백성은 일상적 의료 문제를 사실상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6]. 여말선초 국제 정세의 변화로 단속적(斷續的)인 외산 약재의 수급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강도현, 2009: 150)[ 27]. 여말선초 사인들은 의약을 널리 보급하고, 의료지식을 공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했다. 신유학을 수용하고 인정(仁政)과 박시제중의 유학적 이상을 사회에서 실현코자 했던 이들은 새로운 지배 엘리트였다. 불교보다는 유교에 정치철학적 신념을 두었던 사인들은 의료 자원이 향촌에 미치기 힘든 상황에서 백성들이 종교와 무복(巫卜)에 의지하여 질병과 의료의 문제들을 대처하는 행태에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면 의종 때 관리였던 함유일(咸有一, 1106-1185)은 민심을 현혹한다며 경성 안의 무당을 교외로 내쫓고 민가의 음사(淫祠)를 모두 불살라 무격을 배척했다[ 28]. 문신 민제(閔霽, 1339-1408) 역시 이단을 배척하고 음사를 미워해서 중과 무당을 개가 쫓아내고 약으로 사람을 구하는 상황을 벽에 그려놓아 당시 행태를 경계토록 했다[ 29]. 이외에도 병의 원인을 원혼(冤魂)이나 악귀(惡鬼)/잡귀(雜鬼)의 농간으로 보고 이들 혼귀(魂鬼)를 달래거나 쫓아내는 주술적이거나 신앙적인 치병 의례를 거부하며 의약의 사용과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는 사례는 비교적 많다( 강도현, 2009: 156-164; 이경록, 2018a: 9-37). 사실 귀신은 이기(理氣)라는 신유학적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유학자들 사이에서 종종 논쟁이 되어 왔고, 역병과 같은 국가의 재난에서는 민심의 수습이라는 국가의 역할 그리고 지역의 지배 엘리트로서 지역민의 위무라는 사족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여제를 열고 제문을 써주는 일 등은 분명 유자의 본업 가운데 하나였다[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술적인 치병 행위를 비판하고 의약에 의지할 것을 주장하는 역사의 주체들이 고려말에 등장한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약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들은 약초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약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지역에 약원(藥院)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31], 자신들의 친족 및 식솔이나 지배 지역민의 일상적 의료 문제에 직접 대처하기도 했다[ 32]. 지방관료 혹은 지역의 지배층으로서 이들은 실무를 직접 행하기보다는 이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33], 이를 위해선 의서를 습독하여 의학 및 약물에 대한 지식은 물론 채약인(採藥人)이 실제로 쓰는 향명(鄕名)도 알아야 했다[ 34]. 박시제중하려는 이상을 세상에서 구현하는 좋은 방법은 실제 소용이 되는 의료지식을 그 연원에 상관없이 널리 구하고 가려내 이를 공간하는 것이었다. 앞서 인용한 발문에서 볼 수 있듯이, 『향약구급방』의 생산자 역시 인민(仁民)하는 마음으로 제중(濟衆)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중앙의 의료체계가 미치기 힘든 현장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 이른바 “향약(鄕藥)”이었다. 『향약구급방』 서명에 등장하는 “향약”이란 용어는 고려/조선 고유의 본초를 이른다기보다는 발문에서 말한바 사인층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실제 『향약구급방』에서 다루고 있는 약물로는 대부분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가까운 물(物)들이지만, 일반 서민들이 구하기 어려운 금(金)같은 귀금속이나, 감초(甘草)와 서각(犀角) 등 외국산 약재도 사용한다. 특히 감초의 쓰임은 두드러지는데 외산임에도 왕왕 사람들이 비축해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서각의 경우 관복의 서대(犀帶)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온다[ 35]. 결국 『향약구급방』에서의 “향약”은 고유한 것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자생(自生)과 외산(外産)을 가리지 않고 사대부 여력으로 주변에서 가용할 수 약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의토성(宜土性)을 토대로 용어 “향약”에 지역적 정체성이 연계되기 시작한 것은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1399)과 『향약집성방』 이후의 일이다[ 36]. 한마디로 『향약구급방』의 편찬과 간행은 중앙의 관의학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여말선초 지배층으로 새로이 부상한 지배 엘리트인 사인층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할 때 ‘의료 거버넌스’ 차원에서 강구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인층은 약초의 ‘고유성’보다는 유학의 ‘보편성’에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두었으며, 이들이 『향약구급방』을 간행한 목적은 학술적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이고 경세론적이었다. 발문을 비롯해 『향약구급방』 관련 어떤 기사에서도 최신 중국의학의 토착화, 외산 약물의 대체, 자주의학의 천명과 같은 명확한 학술적 의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책에는 오히려 의학지식의 보편성, 방서의 실용성, 사인의 윤리적 책무가 담겨있었다. 주목건대 이들이 『향약구급방』에 담은 지식은 삼국과 고려에서 전래된 의료 경험과 함께 대략 11세기 이후 유입된 당, 송대 의학지식으로, 고려에서 200여 년 이상의 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증험되고 익은 의약 지식이었다[ 37]. 『향약구급방』에 이두식 향명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방증하고 있듯이, 중국 및 고려의 경험과 지식이 텍스트 층위는 물론 한반도 지역의 실행 층위에서도 쌓여가고 있었다[ 38]. 『향약구급방』은 중심-주변의 단순 구도 하에 중심에서 주변으로 문화가 흐른다는 통상적 인식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실은 한반도에서 오랜기간 동안 숙성되고 집적된 이러한 내적 자원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3. 저변: 『향약구급방』에 담긴 중세의 물질관 및 신체관
이러한 의제 아래 사인층이 600여 년 전에 산출해낸 『향약구급방』의 밑바닥에 흐르는 인체관 및 물질관을 읽어보고자 한다. 단지 중세의 원시성, 비위생적 관념, 미신적 요소의 잔존 등 현재의 관점에서 본 통념만으로는 『향약구급방』과 현대인 사이의 인식론적인 간극을 채울 수는 없다.
먼저, 몸이나 이를 둘러싼 세계가 무엇으로 이뤄졌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학적 관념은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흔히 다음 네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몸 밖 외부 인자의 주재와 침입에 따라 몸 안의 사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다. 외부 인자는 사기(邪氣)일 수도 있고, 독(毒)이나 충(蟲),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들을 죽이거나 몸 밖으로 축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의 초기 형태는 주술(呪術)이나 무의(巫毉)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우주론적 원리에 따라 인체가 천지(天地)와 감응하는 방식으로 몸이 작동한다는 관점이다. 중국 진한대(秦漢代)에 음양(陰陽), 오행(五行), 기(氣) 등의 개념을 동원해 정교화한 상관적 사유방식이 대표적이다. 질병 및 건강의 관건은 외부 인자보다는 우주의 운행 원리에 응하는 인체 내 균형과 조화이다[ 39]. 셋째는 사람의 감정과 정신 활동이 인체의 생리 및 대사활동을 직접적으로 추동한다는 관점으로 감정과 마음을 잘 추스르는 것이 건강 유지와 치유에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40]. 넷째는 세계와 인체의 기능과 작용이 이뤄지는 소이는 본질적으로 물질의 접촉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에서는 질병 역시 물질 성분의 생화학적이고 생물리학적인 과정으로 환원해서 이해할 수 있고 치료는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41]. 인식론적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해, 어떤 의학 활동은 특정한 세계관/인체관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의학 활동들은 (특히 실행 차원에서 보면) 이들 여러 시각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시각 사이의 경계가 흐린 경우가 많다. 『향약구급방』의 경우는 어떠한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전체 치방(治方) 즉 치료 처방 관련 조문 600여개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면의 논리나 설명이 없으며, 이 가운데 현대인이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조목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가능한 독법조차도 다른 해석에 열려 있다. 먼저, 치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그것이 정말 효과를 내는 유용한 지식인지, 그러한 치방을 어떻게 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 치방의 작동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논리는 무엇인지가 되겠지만, 『향약구급방』의 저자는 그것이 유용한 지식이라고 말할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다.
“여러 날고기를 먹고 중독된 경우에는 3자 깊이로 땅을 파서 그 속의 흙 3되를 물 5되와 함께 달여, 5~6 번 끓어 넘치도록 달인다. 그리고 맑은 웃물 1되를 떠서 마시면 바로 낫는다.”[42] “금창(金瘡)으로 창자가 삐져나온 경우에는 사람의 대변을 말려서 창자에 발라주면 창자가 들어간다. 또 화살과 쇠뇌살이 [몸에] 박혀 빠지지 않거나 혹 살에 피가 뭉치는 경우, 여인의 월경포(月經布)를 태워 만든 재를 상처에 붙이거나, 아니면 술과 함께 복용한다.”[43] “동창(凍瘡). 꿩의 뇌수를 바르면 좋다. …… 다른 처방. 돼지기름을 바른다.”[44] “풍사(風邪)로 인해 눈이 충혈되고 깔깔하면서 가려운 경우 처치 방법. 단풍나무 잎 적당량을 물에 넣고 푹 달인 후에 찌꺼기는 버린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 [이것으로] 눈을 씻는다. 2~3번 지나지 않아 차도가 있다.”[45]
위 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치방이 낯설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처치법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다는 설명 외에, 왜 흙인지, 숫자 3이나 5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현대의 독자에게는 불투명하다. 두 번째 역시 사람의 분변을 이용해 탈장을 다루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상에 피가 엉길 때 월경포를 쓰는 정황과 논리는 무엇인지, 그 치료 방식이 낯설다. 술수(術數)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류상동(同類相動)”과 비슷한 논리 같기도 하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그냥 경험지식일 뿐일 수도 있다. 세 번째 사례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넷째, 눈병에 단풍나무 잎을 쓰는 것에 대해선, 우연히 혹은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지식으로 이해하고 그치거나, 후에 나온 권위 있는 텍스트에 기록된 효능 및 주치(主治) 설명에 의지하거나 관련 생화학적 성분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쩌면 단풍나무 “풍(楓)”과 바람 “풍(風)”의 유사성과 어원의 선후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제시된 치방 대부분은 불투명하고, 그 해석조차도 독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치방의 이면에서 읽을 수 있는 중세인의 사유방식을 엿보려는 이 절은 정량적 분석보다도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한 발상의 정황 및 설명의 논리를 더듬어 볼 것이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접촉을 통해서 독(毒)이나 병원물(病源物)이 이동하고 물(物)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다. 다른 의서와 달리 『향약구급방』은 시기(時氣)에 의한 감염이 아닌 중독 관련 응급 상황을 책의 머리에 두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무릇 음식을 먹고 중독된 것을 치료할 때는, 검은 콩을 푹 달여서 그 즙을 마신다. 다른 치방으로, 쪽[ ]을 달여 즙으로 마셔도 독이 풀린다. 제니(薺苨)[ ]를 진하게 달여 즙으로 마셔도 효과가 있다.”[46] “무릇 지네, 벌, 뱀에게 쏘이거나 물려서 생긴 독에는 쑥뜸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 쏘이거나 물리게 되면 쑥봉으로 서너 장 뜸뜨면 독기(毒氣)가 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고 곧 낫는다. 뱀에게 물린 중독에는 사람의 똥을 두텁게 바른다.”[47] “과창(瘑瘡) 치료에는, 돼지기름을 냄새가 나도록 달여서 먼저 창상(瘡上)에 붙이면 벌레들이 모두 나오는데, [이때] 학슬(鶴虱)ㆍ건칠(乾漆)ㆍ무이(蕪荑) 등 살충약을 붙인다.”[48] “지네가 귀에 들어간 경우의 치료법. 돼지고기를 구워 귀를 덮어 막으면 즉시 나온다.”[49]
첫째 예문은 음식에서 유래한 독을 처치하고 있고, 둘째는 해충에 노출되어 독기가 침투하는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두 사례는 실제로 벌레가 몸 안에 침입한 경우이다. 이때 처치 방식은 약을 써서 독을 풀거나, 아니면 벌레를 죽이거나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독을 풀기 위해 쓴 검은 콩, 쪽, 제니, 쑥 그리고 살충약인 학술, 건칠, 무이 등은 본초서적에서도 잘 알려진 해독 및 살충 약물이다. 냄새를 지펴 지네를 유도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쓴 것은 그럴 법해 보이지만, 뱀 중독에 사람 분변을 쓰는 것은 낯설다. 사실 외치법이 절반을 넘는 『향약구급방』에는 중독이나 위급 상황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활용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50]. 이는 분변을 독으로 보고 여기에 독을 누르는 기제가 있다고 보는 ‘이독제독(以毒制毒)’의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규모 있는 의방서(醫方書)에는 해독(解毒), 제독(制毒), 발독(拔毒) 등을 주치(主治)로 하는 약물과 처치법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51]. 독(毒)과 물(物)을 직접 다루는 이러한 의학활동과 달리, 병인론 및 처치법의 대요를 인체내 세력의 불균형한 정황에 두었던 이른바 상관적 사유도 관찰된다. 바로 중앙의 주류 의학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본초학의 약리이론을 원용해 이해할 수 있는 사례다.
“발배(發背) 치료법. 초결명(草決明)[……] 신선한 것 1되를 빻아서 가루 내고, 감초 1냥도 잘게 부순 다음에 물 3되와 함께 달여 2되가 되도록 졸인다. 2회분으로 나눠 따뜻하게 복용한다. 대체로 피가 통하지 않으면 종기가 생긴다. 간(肝)은 피를 모아두는 장기인데, 초결명은 간의 기운을 풀어주면서도 원기(元氣)는 해치지 않는다.”[52] “금창(金瘡)으로 몸 안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포황(蒲黃)[앞에 나왔다]과 당귀(當歸) 가루를 복용하는데 하루 3번 쓴다.”[53] “피부의 풍양(風痒) 치료법. 질려(蒺藜) 잎을 달인 물로 씻으면 좋다.”[54]
보기 드물게 첫 번째 사례는 인체 내부 장기인 간을 언급하며 약물 초결명의 기전을 설명한다. 이것은 비전문인을 상정한 『향약구급방』에서 거의 예외적인 사례로, 대부분은 둘째와 셋째 사례처럼 처치법만 나열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 특히 초목을 약재로 쓰는 대부분은 모두 체계화된 본초학 이론이나 장상(臟象) 이론을 동원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55]. 이를테면 위인용문에서 포황은 지혈(止血)약이고, 당귀는 보혈(補血)약이며, 질려는 심히 가려운 피부병을 다스리는 약물이다. 『향약구급방』 부인잡방(婦人雜方)편에(탕제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물탕(四物湯)과 불수산(佛手散)을 제시하고 있는데[ 56],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약물을 포괄하고 있는 본초학의 설명 양식은 맛으로 경험되는 약물의 성미(性味) 그리고 임상에서 경험되는 주치 증상에서 출발해 장부와의 연계성[歸經]을 찾아내고 인체 내 작용 양상을 기술하고 있는 효능(効能)으로 귀납하는 것이다. 종종 이러한 약물학적 지식을 넘어 왜 특정한 약물이 그러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자연철학적 질문도 다루고 있는데, 주로 금, 원대 및 청대 의학을 거치면서 감응(感應)을 기제로 하는 세련된 상관적 사유체계 안에 이들이 포섭됐다. 주로 약물의 형태, 색깔, 기미(氣味), 채취시기, 사용부위, 산지(産地), 질(質), 성정(性情)의 특징과 약물 작용의 상관관계를 기(氣), 음양, 오행, 기수(氣數), 체용(體用) 등 우주론적이고 기술적인 장치들을 동원하여 체계화하려고 한 것이다[ 57]. 상위의 이론적 층위에서 보자면 『향약구급방』에 등장하는 모든 치방을 약물의 성미와 주치로 환원하여 음양오행 등 상관적 사유체계로 설명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58], 문화의 저변을 읽어보기 위해선 낮은 층위에서 거칠고 다르게 보이는 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논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논리는 유비(類比)의 전용(轉用)이다.
“『향약구급방』. 출산이 어려울 경우의 치료법. 참기름 2종지에 메밀가루를 고르게 섞어 묽은 풀처럼 만들어 단번에 복용하면 즉시 출산한다. 효험이 있다. 출산이 힘들거나 포의(胞衣)가 나오지 않을 경우의 치료법. 신선한 쇠똥을 산모의 양 젖가슴 사이에 바르면 즉시 나온다. 신기하게 효험이 있다. 출산 후 즉시 씻어내야 하는데, 꾸물거리면 창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신선한 쇠똥을 취하는 법. 소의 습성에 [고삐를] 당기면 배변하는 성질이 있으니, 그런즉 똥을 싼다].”[59] “생선가시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의 치료법. …… 또 다른 치방에, 가마우지 분(糞)[똥]을 물에 타서 목구멍 바깥에 바르면 곧 [생선가시가] 빠져 나온다.”[60]
첫째 사례에서 난산에 참기름을 쓴 것은 그 매끄러운 성질 때문으로 보이는데 느끼함이나 향이 실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기나 태반이 나오지 않을 때 쓰는 쇠똥 역시 향이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듯한데, 이를 골랐던 까닭은, 농촌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듯이 소가 많은 양의 똥을 푸짐하고 시원하게 싸기 때문일 것이다.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린 둘째 사례는 물고기를 잘 잡는 가마우지가 생선을 목으로 금방 넘기는 장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61]. 이 두 사례가 효과가 있다고 경험되면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약물 여기서는 동물이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 위에서 잠깐 설명한 형색기미(形色氣味)/성정(性情) 등을 들어 설명하는 방식에 포섭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질려(蒺藜)가 풍사(風邪)때문에 피부가 가려운 증상을 다스릴 수 있는 까닭은 열매에 모나지 않은 가시가 있어 식풍(熄風)할 수 있기 때문이라거나, 마황(麻黃)이 땀으로 한기(寒氣)를 떨궈낼 수 있는 것은 줄기가 가늘고 비어있어 땀구멍과 닮았고 마황이 있는 자리에는 눈이 쌓이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다거나, 인삼(人蔘)이 진액을 만들어주면서도 기(氣)를 보할 수 있는 소이는 습윤한 곳에서 싹을 틔우면서도 줄기가 셋에 잎이 다섯인 형태로 자라니 음지(陰地)에서 생겨나 양성(陽性)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논리와 유사하다[ 6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황이나 인삼 등 전문적인 약물이 성미(性味)를 중심으로 복잡한 음양오행의 설명틀 안에서 전문가에게는 점점 익숙해지는 반면, 경험 방서에 종종 등장하는 주변의 낯익은 물(物)들은 오히려 후대 일반 독자에게는 낯설게 경험되곤 한다. 이런 차이점에 주목해 이를 상위의 상관적 사유체계 하나로 포괄하지 않고 유비(類比)의 전용(轉用) 혹은 유감적(類感的) 사유란 표현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위 사례에서 일부 보았듯이 사람이나 동물의 똥, 오줌, 흙, 재, 피 등은 『향약구급방』의 처치 방법 특히 독기를 다스리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다스릴 때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사례에서 물(物)을 매개로 생명력이 전이되고 순환한다는 관념을 읽을 수 있다.
“더위 먹어 죽으려고 할 경우 치료법. …… 또 다른 처방. [더위로] 혼절한 사람을 똑바로 눕힌 후에 뜨거운 흙을 배꼽 언저리에 쌓아두고 사람을 시켜 오줌을 누도록 한다. 한 사람이 오줌을 다 누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오줌을 누도록 해 배꼽 언저리가 따뜻해지면 곧 낫는다. 또 다른 처방에, 진하게 달인 여뀌[蓼] 즙 3되를 마시면 즉시 낫는다.”[63] “어린이가 갑자기 죽은 듯 혼절하는 경우의 치방. 불에 태운 돼지 똥을 물에 풀어서 만든 즙을 복용시킨다. 다른 처방. 고삼(苦蔘)을 식초와 함께 데워서 만든 즙을 입에 넣으면 즉시 살아난다. 다른 처방. 소금물을 달여서 아주 짜게 해 [환자의] 입에 흘려 넣어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곧 살아난다. 다른 처방. 뜨거운 물을 재와 섞어서 온몸을 두텁게 둘러주면 곧 살아난다.”[64] “이가 나지 않는 경우의 치료법. 암탉똥[끝이 동그란 것이 암]과 수탉똥[끝이 뾰족한 것이 수], 이 둘을 동일한 분량으로 곱게 간 후, 바늘로 이가 나지 않는 부위를 찌른 후에 붙여준다. 노인은 20일, 젊은이는 10일이면 이가 나오려고 한다.”[65] “이가 나지 않는 경우의 치료법. 쇠똥 속의 콩을 태운 재를 곱게 간 다음에, 우선 바늘로 [잇몸을] 찔러 피가 약간 나오면 즉시 그 재로 문질러주면 좋다.”[66]
첫째와 둘째 사례는 과도한 수분 손실을 비롯한 어떤 이유로 정신을 잃은 응급상황에서 진하게 달인 소금물, 여뀌 즙, 고삼 즙 등으로 전해질과 수액을 늘리면서 따뜻한 오줌과 흙, 재를 이용해 복부를 중심으로 원활한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의원이라면 급히 회양(回陽) 즉 복부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도 인삼이나 부자(附子)를 썼을 것이다[ 67]. 이처럼 필요한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가축을 쓰기도 하는데, 단독(丹毒)이 온몸에 퍼져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는 소아나 전쟁터에서 전신 자상 등 온몸에 중상을 입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살아있는 돼지나 소의 배를 갈라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다[ 68]. 접촉을 통해서 독을 빼주고 생명의 근원인 순환을 활성화해서 회생을 도운 것이다. 이처럼 생명이 오고가는 응급 상황에서 동원되는 각종 똥, 흙, 재, 피 등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셋째 사례는 이가 빠진 후 이가 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음(陰)과 양(陽)의 결합에 따른 생성 과정을 유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둘째 셋째 사례에서 하필 분변을 활용하는 중세인들의 관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지막 사례는 소의 내장에서 해독되고 단련되어 살아남은 콩이 똥이라는 최종 찌꺼기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에 싹 즉 치아를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약구급방』에서 위급상황을 다룰 때 치료 처방에 자주 등장하는 분변을 보건대, 이들이 한편 독(毒)을 제압하기도 하지만 생명체에서 나온 마지막 찌꺼기로서 오히려 생명체를 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향약구급방』에는 약물을 사용하지만 그 효과보다도 절차로서 조제법, 복용법, 금기사항 등 특별한 행위 자체가 부각되는 몇 가지 사례가 보인다. 예를 들면, 치방에서 의례나 술수(術數)가 의미를 지니는 경우이다.
“열성이건 냉성이건 모든 창종(瘡腫), 정창(釘瘡), 표저(瘭疽)를 두루 치료하는 처방. 맥반석(麥飯石)[ㅊ`ㄹ돌, 붉은색을 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불그스름하게 구운 후 식초에 담그는 [여러] 과정을 통해 부서질 정도로 만들어 가루를 내고, 삭조(蒴藋)를 줄기와 잎을 태워 재로 만드는데 겨울에는 마른 줄기와 뿌리도 괜찮다. 위 약물 2가지 각각 2분량과 [수]쥐똥과 암참새똥 각각 1분량을 가루 내고, 식초[苦醋] 1분량과 돼지기름 2분량을 앞의 4가지 약재들과 함께 골고루 섞는다. [이를] 창두(瘡頭)에 붙이는데, 우선 창두에 14장 혹은 21장 뜸을 뜨고, 바늘로 딱지를 제거해 붉은 살이 드러나게 한 다음 약을 붙인다. 부은 부분에 두루 바르고 기름종이로 그 위를 덮어주는데 하루에 2번 바꿔준다. 뜸을 뜨지 않을 경우, 바늘로 창두를 찔러 피를 내서 통기시킨 다음 약을 붙인다. 효과가 묘하다.”[69] “건우(乾藕). 민간에서는 년 이라 부른다. 맛은 달고 독은 없다. 7월 7일에 딴 꽃 7분량, 8월 8일에 캔 뿌리 8분량, 9월 9일에 딴 열매 9분량(그늘에서 말린 후 빻아서 체질한 것)을 방촌시로 복용하면 늙지 않는다.”[70] 이라 부른다. 맛은 달고 독은 없다. 7월 7일에 딴 꽃 7분량, 8월 8일에 캔 뿌리 8분량, 9월 9일에 딴 열매 9분량(그늘에서 말린 후 빻아서 체질한 것)을 방촌시로 복용하면 늙지 않는다.”[70] “그리마[그르메너흘이] 오줌에 그림자가 닿은 탓에 좁쌀이 켜켜이 한데 뭉친 것 같은 부스럼이 생기고 몸이 아픈 경우의 처방. 땅에 그리마를 그리고 이를 칼로 아주 잘게 쪼갠다. 그리마 뱃속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해 침에 개어서 진흙을 만들어 두 차례 바르면 낫는다.”[71] “생선가시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의 치료법. …… 또 다른 처방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 1잔을 두고, 동쪽을 향해 앉은 채 손가락으로 ‘용(龍)’자를 쓴 다음에 이를 마시면 즉시 [생선가시가] 내려간다. 글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을 시켜 쓰는 것도 가하다.”[72]
다소 긴 첫 번째 조문은 완고한 피부병 치료에 쓰이는 통치방(通治方)으로 다소 복잡한 수치(修治) 과정 및 조제법을 동반하는 연단술(鍊丹術) 전통의 비방으로 보인다. 후대 『본초강목(本草綱目)』(1596)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1613)에 수록된 유사 처방을 참조해보면, 맥반석 담금질을 10차례, 연마 과정도 5×7회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조제 과정에는 월경중인 여성이나 임신부 등이 보아서 안 된다는 비약물학적 금기사항도 있다[ 73]. 이때 [수]쥐똥과 암참새똥을 쓰는 것은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는 논리뿐 아니라 음양 결합에 따른 생성의 상징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74]. 이처럼 복잡한 제조과정은 분명 집적된 기술 및 경험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세계와 관계 맺는 문화적 행위의 산물이기도 하다[ 75]. 이러한 문화적 행위가 두드러진 사례로 술수(術數)와 연관된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사례가 그것인데, 장수를 돕는 약물 연근(蓮根)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반복된 숫자들은 물질 및 세계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가 천일(天一) 및 지이(地二)에서 출발하는 수리(數理)에 있다는 사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약물의 적절한 양과 관련된 수를 정하는 것은 대개 경험적으로 결정되지만 연년익수(延年益壽)를 목표로 하거나 채취 계절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택일(擇日)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주기와 숫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76]. 이러한 상징과 의례로서의 절차는 벌레 분비물과의 접촉으로 부스럼이 생겼을 때나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약물의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행위를 더하는 셋째 및 넷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사례가 약물 사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조적으로 의례를 동반한 것이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가마우지”를 입으로 왼다든지[ 77], 피부질환인 정창(疔瘡)에 걸렸을 때 삼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78]. 이는 약물 사용을 전제하지 않는 상징적 의례라는 점에서 미신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병의 원인을 원혼이나 악귀 등 귀신의 농간으로 돌리는 것은 배제한다는 점에서 대개 사대부가 배척했던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치병의례와는 구별된다[ 79]. 이상 수록된 치방을 매개로 『향약구급방』에 전제돼 있는 세계관, 물질관, 신체관을 헤아려 봤다. 이는 간접적으로 물(物)에 대한 중세인의 문화적 관념 및 저변을 엿본 셈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하며 이 절을 마무리한다. 먼저, 살펴본바 중세인의 세계관으로 천인상응(天人相應)으로 대표되는 상관적 사유 외에도, 외부 독물이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유비를 전용하는 방식으로서의 유감적인 사유, 극과 극이 만나 생명력이 전이되고 순환된다는 생각, 수리(數理)에 따라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한다는 믿음, 절차로서 상징과 의례를 안고 있는 실행 등을 포괄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고 종종 중첩적이다. 다음으로, 『향약구급방』에 등장하는 물(物)은 근대의 담장 안에서가 아닌 열린 지평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인간과 물(物)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과 경험되는 양상은 존재하는 시공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거친 들판에서 볼 수 있는 수참 새똥과 옹절(癰癤), 현벽(痃癖), 산가(疝瘕) 등에 쓰는 성질이 따뜻한 약재 백정향(白丁香), 투박한 시골의 논밭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와 이를 원료로 만든 핸드백 속의 유명 화장품, 윗목에 놓인 요강 속 오줌과 이른바 과학적 방법으로 성분을 추출해 제형화한 의약품, 농가의 일꾼이자 길동무인 소 누렁이와 마트 진열장에 전시된 쇠고기 포장육, 이들 각기 짝은 서로 기원은 같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들 각 쌍들은 동일한 상동관계를 이루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근대인의 시선은 이중적인 경우가 많다. 셋째, 『향약구급방』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낯익은 물(物)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전문인용 가정 상비 의료 지침서인 까닭에, 고려의학 전반을 논할 때는 또 다른 공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바로 고려의 『어의촬요방』 같은 전문가용 의서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의료자원의 수급이 비교적 원활한 중앙의 의료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혹자는 본 절의 논의에서 여말선초 역사 주체의 목소리가 없다거나 이를테면 조선 후기의 문화적 저변도 그 양상이 비슷하지 않냐며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이 절은 중세의 의료문화사 전반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향약구급방』에 한정해 여기에 전제된 몸, 물질, 세계에 대한 관념을 읽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대한 관련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치방을 중심으로 이를 추론하고 해석해 내는 것이 본 절에서 수행한 작업이었다[ 80]. 종종 사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세의 이른바 ‘치유문화’를 다룬 글들이 적지 않지만, 의도치 않게 이들은 종종 불충분한 맥락화로 인해 과학의 상대 개념이 되어버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중세의학을 과학사/의학사에서 소외시켜왔다. 이런 서술방식과 거리를 두고 문제풀이 활동이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글은 역사의 주체들이 제시한 해법인 『향약구급방』의 여러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본 절은 그 가운데 세계관을 탐색했다. 『향약구급방』은 중세 동아시아 이를테면 당, 송 및 삼국, 고려의 의약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중층의 텍스트이자 기층문화와 가까웠던 실용서인 까닭에 비교적 긴 시간 여러 유사 의학 활동과 문화적 저변을 공유한다. 하지만 유럽의 특정한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 등장한 단절 및 혁명 중심의 이분법적 역사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역사의 주체들이 당면한 의학적 문제들을 풀어내는 해법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대개 옛것과 새것이 조합된 즉 지속과 갱신이 어우러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신구의 개념, 발상, 기술, 도구 등의 제 요소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상호 연관시키고 재배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의학 실행 스타일로서 『향약구급방』은 이를테면 조선후기 구급의서와 비슷한 점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이들과 구별되는 다른 특징도 갖고 있다.
4. 해법: 『향약구급방』의 의학 실행 스타일
『향약구급방』의 특징을 보건대, 여말선초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의료지형의 특정한 영역을 담당했던 『향약구급방』은 주류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궁중의학이나 그 상대자인 민간의료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포괄하기 힘든 나름의 고유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81]. 먼저, 질병 분류에 있어서 『향약구급방』은 질서와 원리를 중시했던 규범적인 종합의서 및 구급의서 전통과 달리 중독과 관련된 일상의 구급 질환을 앞에 배치했다. 풍(風)을 모든 질병의 근원이자 우두머리로 보는 의학고전 『황제내경(黃帝內經)』의 전통을 따라 의서는 중풍(中風)이나 육음(六淫: 風, 寒, 暑, 濕, 燥, 火)으로 인한 병을 책의 머리에 놓아 여타 질환을 이끌고 있는 구성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향약구급방』은 편제상 중풍이나 상한(傷寒)/중한(中寒)이 아닌 중독 질환 즉 식독(食毒), 육독(肉毒), 균독(菌毒) 등을 앞에 세우고 골경방(骨鯁方), 식열방(食噎方), 졸사(卒死), 이열갈사(理熱暍死) 등의 순서로 그 나머지를 배치했다[ 82]. 자연철학적 분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중독질환 특히 식독을 맨 앞에 세웠다는 사실은 여말선초 식중독을 포함한 중독이 흔하거나 자주 경험되는 질병 가운데 하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뒤따르는 조선의 구급의서 역시 규범적 종합의서 전통을 따라 풍한(風寒) 등 육음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구급의학 전통에서 『향약구급방』은 두드러진다[ 83]. 이른바 기일원론적인 세계관과는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향약구급방』편찬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 것이다. 창졸간 생긴 질환을 다루는 향촌의 의료 지침서로서 『향약구급방』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도구 및 기술은 기본적으로 단방(單方) 중심의 향약과 이를 가지고 병독(病毒)을 제압하는 것이다. 치료를 위한 다양한 도구 및 기법 예를 들어 약물, 쑥뜸, 도포(塗布), 첩부(貼付), 점적, 찜질 등 여러 처치법이 동원되지만, 본초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약재 여럿으로 구성된 복방(複方)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물(物)을 활용한 단방이 다수를 차지한다[ 84]. 약물을 사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일반적 기법은 염증이나 독소 같은 병변 부위의 병독을 처리하는 한편 동시에 인체 내의 의도적 순환을 통해 소통과 균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쉽게 알 수 없는 인체 내부의 사정은 논외로 하고 있는 『향약구급방』은 이러한 일반적 기법 가운데 병독을 제압하거나 해소하는 방식만을 채택했다. 그것도 주로 한두 가지 약물만 쓴다. 외과전문서인 『치종지남(治腫指南)』(16세기)과 달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과술도 다루고 있지 않다[ 85].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급이란 상황과 비전문인을 위한 가정 및 향촌의 의료지침서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전문 인력 및 양질의 약재 등 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궁중에서 쓰였던 『어의촬요방』이 복방 중심의 다양한 약재를 구사했던 점과 비교된다( 이경록, 2010: 265-273). 주목건대, 『향약구급방』이 다루고 있는 약물로는 자연에서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물(物)만이 아니라 해마다 갈무리해 놓은 식재료와 미리 만들거나 갖춰서 준비해둔 약물도 적지 않다. 『향약구급방』에는 지배 엘리트인 사인층의 윤리적 정체성과 자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글쓰기 양식이 발견된다. 앞서 논의했듯이, 『향약구급방』 관련 주체들은 여말선초의 사인층이며 『향약구급방』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공간에서 이들이 박시제중의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 흥미롭게도 『향약구급방』에는 선행 문헌에 대한 검토 및 의론이 전혀 없으며 인용 근거를 밝힌 것은 처방 조문 550여개 가운데 서너 개에 불과하다[ 86]. 이는 조선후기 사대부 정약용(丁若鏞)이 인용 문헌을 중심으로 치밀한 텍스트 비교와 탐구를 통해서 의서 『마과회통(麻科會通)』(1798)을 저술한 것과 대비된다. 인정(仁政)의 이상은 동일했지만, 14세기 전후의 사인층은 18세기말 사대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학지식을 생산해 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약구급방』에는 오언시(五言詩)도 보이고, 전(傳) 형식의 「고전록험방(古傳錄驗方)」이 권말에 부가되는 등 유가의 글쓰기 방식도 엿보인다[ 87]. 『향약구급방』의 저자는 동물을 살상해 약물을 제조하는 과정을 글로 남기지 않는다[惡傷物命]는 언명으로 자신들의 윤리적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88]. 의료현장에서의 환자-의사 간 문화적 권력관계도 사인층의 윤리적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여말선초 사인들이 종교적이고 무술적인 치병의례를 거부하고 의약을 쓸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향약구급방』 역시 원혼이나 귀신을 병의 빌미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지휘자인 사인들이 환자로서의 식솔 및 지배 지역민을 대하는 태도는 온정적이자 계몽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약구급방』에 드러난 의학 지식의 성격 및 텍스트와 관계 맺는 방식은 의가의 신비적이고 기술적인 의학과 다를 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이 사인층으로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유의들의 의학과도 다르다. 비전문가에게 유용한 『향약구급방』은 비전에 의해서 전수되는 난해하고 신이한 의학 전문가의 의학과는 다른 것이었다. 『향약구급방』의 간행은 이전에 의학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존재했던 의학지식이 텍스트 형태로 공유되는 방식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의학지식이 이행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송, 금, 원대를 거치며 등장한 중국의 유의처럼 유학적 소양을 배경으로 하는 문식 있는 의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학적 지식의 획득과 전수 과정에는 텍스트를 통한 학습과 심득(心得)이 강조되고, 그 의학적 효과는 종종 시술자의 도덕적 수양, 의(意), 전문가적 경험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Leung, 2003). 하지만 『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한 의학 활동은 사인층이 주체이면서도 이와는 사뭇 다르다. 『향약구급방』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기 쉬운 질병에 알기 쉬운 약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경험방서이자 일종의 안내책자이다. 이 의학 스타일은 정연한 질서, 의학적 원리, 정합적 설명, 고전의 학습, 도덕적인 수양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긴급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급선무인 까닭에, 치방의 효과 여부, 도구로서 약물의 확보, 요강이나 과정의 숙지, 절차적인 의례, 응급 처치법 수행 자체가 더 중요했다. 이러한 특징은 이들 의학 활동이 상식적인 의미에서 주류의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이른바 관의학, 학술의학, 유의의학 등과는 다른 또 하나의 “의(醫)”임을 보여준다.
5. 맺음말
이상 『향약구급방』을 두고 이분법의 인식틀 아래 근대적 관념들을 동원해서 파악코자 했던 전통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말선초 『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활동을 다시 읽어보았다. 관련 행위자들의 문제의식과 주체적 의학활동을 드러내기 위한 접근방법은 우선 “의(醫)”를 사회적 조건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의학활동으로 규정하고, 그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의 특징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향약구급방』은 여말선초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인층이 의료 거버넌스 차원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식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었으며, 흥미롭게도 『향약구급방』은 중앙의 주류 의학인 관의학이나 이른바 중국의 유의의학과도 구별되는 세계관, 물질관, 신체관, 지향점을 담고 있는 ‘의학실행[醫]’이었다. 이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문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향촌의 현실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시 사인들의 최선 방책은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약물을 중심으로 가정 의료지침서를 만들어 간행하는 것이었다. 바로 『향약구급방』이다. 이 텍스트에 수록된 치방의 이면에서 읽을 수 있는 중세인의 세계관은 독물의 인체 침습, 음양결합의 역동성, 우주와의 감응, 생명력의 전이/순환, 유비의 전용, 절차로서의 의례, 유감의 논리 등 몇 가지 관념이 얽혀있는 것이었다. 또한 『향약구급방』의 향약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물(物)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용어는 고려/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현지에서의 구득성(求得性)을 지시하는 로컬리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향약구급방』 관련 주체들은 유학의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자 기술로서 “향(鄕)”을 취한 것이다. 고려 의서 『향약구급방』은 한국 구급 의학 전통의 원류라고 할 수 있지만, 질병 분류 방식에 있어서 중독을 편제상 첫머리에 둔다는 점에서 육음을 앞세웠던 후대의 구급 전문 의서와는 다른 의학 실행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학에 대한 대표적 통념인 기일원론적인 세계관과는 성격이 달랐던 또 하나의 의학 지형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상의 특징은 『향약구급방』이 단지 중국의학 유입의 절충물, 합리적 의학의 전구, 자주적 의학의 발로, 중세의학의 원시성 등의 술어로만 설명될 수 없는 독자적인 의학사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References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東文選』, 『東國李相國集』, 『鷹鶻方』, 『鄕藥救急方』, 『鄕藥濟生集成方』, 『鄕藥集成方』, 『本草綱目』, 『東醫寶鑑』, 『村家救急方』, 『默齋日記』, 『舟村新方』, 『景岳全書』, 『本經疏證』, 『本艸問答』..
강 도현, 「고려후기 성리학 수용과 질병 대처 양상의 변화」, 『도시인문학연구』 1-1 (2009), pp. 139-169.
강 명관,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서울: 천년의상상, 2014).
강 문식, 「성리학의 수용과 성격」, 정요근 외 지음, 『고려에서 조선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2019), pp. 48-74.
강 연석, 「『鄕藥集成方』의 鄕藥醫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 pp. 277-297.
권 경인·이 병욱·김 은하, 「道敎 倫理와 孫思邈의 醫德에 관한 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8-1 (2005), pp. 49-56.
김 기욱 et al, 『韓醫學通史』 (고양: 대성의학사, 2006).
金斗鍾, 『韓國醫學史 全』 (서울: 탐구당, 1981[1966]).
金 庠基, 高麗前期의 海上活動과 文物의 交流」, 『東方史論叢』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pp. 441-461.
김 석준 et al, 『거버넌스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2).
김 성수, 「18세기 후반 의학계의 변화상: 『欽英』으로 본 조선후기 의학」, 『한국문화』 65 (2014), pp. 99-134.
김예몽 외 편, 이경록 역, 『의방유취』 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김 옥걸, 「고려내항 송상인과 여·송의 무역정책」, 『대동문화연구』 32 (1997), pp. 31-43.
김 용선, 『개정판 역주 고려묘지명 집성(상)』 (춘천: 한림대학교출판부, 2006).
김 인호, 「高麗後期 士大夫의 經世論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김 인호, 「원간섭기 이상적 인간형의 역사상 추구와 형태」, 『역사와 현실』 49 (2003), pp. 37-66.
김 종현·손 장호·이 환희·김 도훈, 「중국 본초서에 실린 우리나라 본초」,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1-3 (2018), pp. 1-32.
김 호, 「18세기 후반 居京 士族의 衛生과 의료: 『欽英』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1 (1998), pp. 113-144.
김 호, 「여말선초 ‘鄕藥論’의 형성과 『鄕藥集成方』」, 『진단학보』 87 (1999), pp. 131-149.
남 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남 권희, 『지식정보소통과 한국 금속활자 발달사-고려시대』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8).
도 현철, 「원간섭기 『사서집주』 이해와 성리학 수용」, 『역사와 현실』 49 (2003), pp. 9-36.
孫 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硏究』 (서울: 수서원, 1988).
송 웅섭, 「지배세력의 변동과 유교화」, 정요근 외 지음, 『고려에서 조선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2019), pp. 22-47.
신 동원, 「조선후기 의원의 존재 양태」, 『한국과학사학회지』 26-2 (2004), pp. 197-246.
신 동원, 「조선시대 지방의료의 성장-관 주도에서 사족 주도로, 사족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강릉 약계(1603~1842)의 조직과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5 (2006a), pp. 1-29.
신 동원, 「조선후기 의약생활의 변화: 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미암일기』, 『쇄미록』, 『이재난고』, 『흠영』의 비교 분석」, 『역사비평』 75 (2006b), pp. 344-391.
신 동원, 『조선의약생활사』 (서울: 들녘, 2014).
신 동원, 「미시사 연구의 방법과 실제」, 『의사학』 24-2 (2015), pp. 389-422.
신 영일,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안 상우, 『孝宗命撰 (국역) 三方撮要1』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안 상우, 「『三方撮要』의 편찬과 傳存내력」, 『한국의사학회지』 31-2 (2018), pp. 1-8.
안 상우·최 환수, 『御醫撮要 硏究』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오 재근,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의 『증류본초』 활용」,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4-5 (2011), pp. 107-118.
이 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서울: 혜안, 2010).
이 경록, 「鄕藥에서 東醫로: 『향약집성방』의 의학이론과 고유 의술」, 『역사학보』 212 (2011a), pp. 243-248.
이 경록, 「『향약집성방』의 편찬과 중국 의료의 조선화」, 『의사학』 20-2 (2011b), pp. 225-262.
이 경록, 「조선초기의 성리학적 의료관과 의료의 위상」, 『의료사회사연구』 1 (2018a), pp. 9-37.
이경록 옮김, 『국역 향약구급방』 (서울: 역사공간, 2018b).
李 德鳳, 「鄕藥救急方의 方中鄕藥目 硏究」, 『亞細亞硏究』 6-1 (1963), pp. 339-364.
李兆年 著, 이원천 역, 『校註國譯 鷹鶻方』 (서울: 在釜密星會, 1994).
이 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파주: 창비, 2009).
이 현숙, 「고려시대 官僚制下의 의료와 民間醫療」, 『동방학지』 139 (2007), pp. 7-45.
이 현숙·권 복규, 「고려시대 전염병과 질병관: 『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2007), pp. 581-615.
임 진석·박 찬국, 「鄒澍의 醫學四象에 대한 연구: 藥理說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9 (1995), pp. 381-429.
장 동익,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장 동익, 『日本古中世 高麗資料硏究』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정 요근 et al, 『고려에서 조선으로: 여말선초, 단절인가 계승인가』 (서울: 역사비평사, 2019).
정 유옹·김 홍균, 「『鄕藥救急方』의 口舌脣齒 질환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1-2 (2008), pp. 79-93.
唐宗海 저, 김준기 역, 『國譯 本草問答』 (서울: 대성문화사, 1996).
鄒澍 저, 임진석 역, 『本經疏證 上/下』 (서울: 아티전, 1999)).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 思文閣出版, 1991[1963]).
马 伯英, 『中国医学文化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0).
Leung, Angela Ki Che, (梁其姿) “Medical Learning from the Song to the Ming,” Paul J. Smith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p. 374-398.
Furth Charlotte, ed. Producing Medical Knowledge through Cases: History, Evidence, and Action, Furth Charlotte·Zeitlin Judith T.·Hsiung Ping-cheng, eds. Thinking with Cas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pp. 125-151.
Hinrichs TJ, ed. The Medical Transforming of Governance and Southern Customs in Song Dynasty China (960-1279 C.E.), PhD diss. (Harvard University. 2003).
Porter David L., ed. Comparative Early Modernities: 1100-1800 (London: Palgrave, 2012).
Suh Soyoung, Naming the Local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7).
Scheid Volker,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Plurality and Synthesis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2).
Unschuld Paul P., Medicine in China: A History of Idea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
 이라 부른다. 맛은 달고 독은 없다. 7월 7일에 딴 꽃 7분량, 8월 8일에 캔 뿌리 8분량, 9월 9일에 딴 열매 9분량(그늘에서 말린 후 빻아서 체질한 것)을 방촌시로 복용하면 늙지 않는다.”[70]
이라 부른다. 맛은 달고 독은 없다. 7월 7일에 딴 꽃 7분량, 8월 8일에 캔 뿌리 8분량, 9월 9일에 딴 열매 9분량(그늘에서 말린 후 빻아서 체질한 것)을 방촌시로 복용하면 늙지 않는다.”[70]